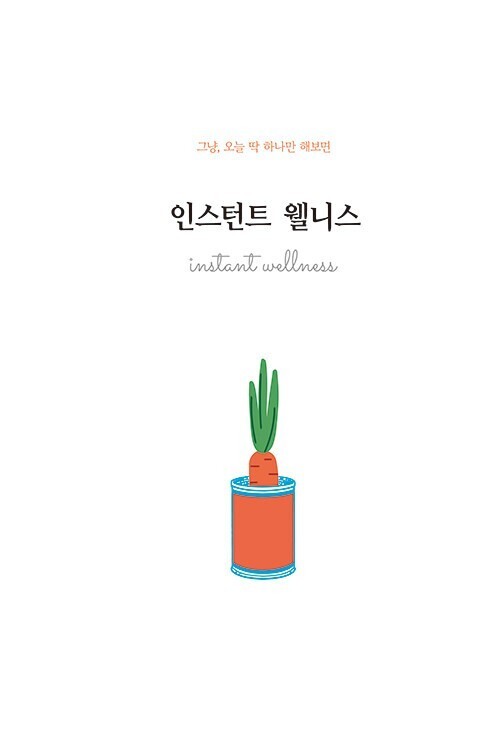[액티브 시니어] 한식날의 유래와 세시풍속



[시니어 칼럼]

|
한식은 설·단오·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이날은 손 없는 날로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사를 하거나 산소에 손을 대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잔디가 죽고 움푹 패이거나 쥐구멍이 난 곳에 흙을 북돋고, 풀을 뽑고, 주변에 잔디와 나무를 심는 풍습이 생겼다.
한식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절기였으나 한국에 들어와 우리의 고유한 명절로 정착돼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한식날에는 새 불을 만들어 임금께 올렸다. 불이 꺼지지 않게 불씨통에 은행이나 목화 씨앗 태운 재에 묻어 운반했다고 한다.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부분 종가는 사당에 4대조까지 신위를 모시고 기제를 지내고, 그 윗대조는 시제(묘제)를 지낸다. 그러나 방안 기제를 지내지 않고 묘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산소를 찾아가 관리를 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묘제를 지내는 것이다. 묘제는 방안 기제와 동일한 형식으로 지내지만 제물을 간소하게 차린다.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토지신에게 간단한 제를 올리고, 조상의 산소에 묘제를 지낸다. 토지신에게 먼저 제를 올리는 것은 그동안 조상의 묘를 지켜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지켜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조상의 신은 지하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늘에 계시면 향불의 연기를 타고 내려오고, 지하에 계시면 술을 산소 주위에 부어 술을 따라 올라와 모신다는 의미다. 신을 모시지 않고는 제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술은 원래 신이 먹는 음식이었으나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를 올릴 때 밥보다는 술을 올리는 것이 신을 위한 배려이다. 그래서 어떠한 제례에도 술 없는 제례는 상상할 수 없다. 제를 마치면 음복을 하고 신위나 축문을 불태운다. 산불이 나지 않게 흙구덩이를 파고 불살라야한다. 음복을 해야 조상이 내려준 복을 받는다는 속설이 내려온다.
정운일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