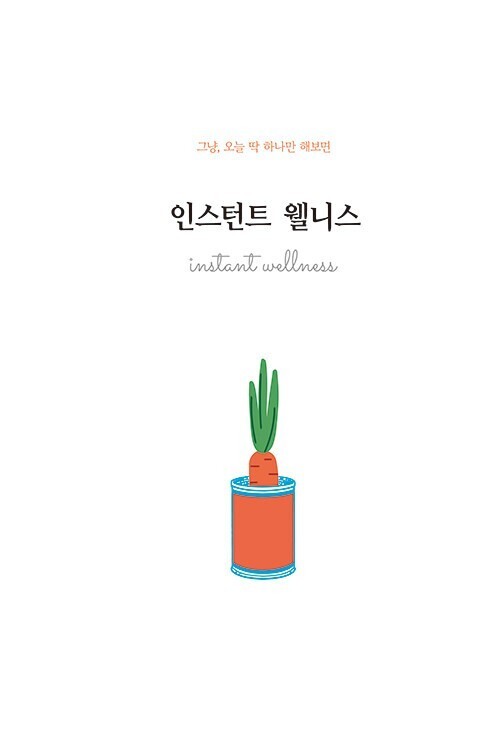[액티브 시니어] 설날의 유래와 세시 풍속



<시니어 칼럼>

|
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코로나19 탓에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다음주에는 고향을 찾기 위해 민족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설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족과 만나 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일제는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떡방앗간을 폐쇄하고 설날에 설빔을 예쁘게 입고 나온 어린이들에게 먹칠을 하기도 했다.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설날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5년 ‘민속의날’로 지정되어 하루 공휴일이 되었지만, 24절기 모두 ‘민속의날’이라 이름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1989년 음력 1월 1일부터 설날이라고 정했다. 작곡가이며 아동문학가인 윤극영 선생의 동요 ‘까치 까치 설날은…’으로 시작되는 ‘설날’에서 유래되어 설 전후 3일간 법정공휴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설날을 일제강점기 때 부르던 ‘구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설날의 세시풍속은 매우 다양하다. 차례를 지낸 후 차례상에 올린 떡국과 명절음식을 음복하고 어른께 세배하고 덕담도 나눈다. 또한 이웃 및 친인척을 찾아 세배하는 일도 중요한 풍습이다. 요즈음은 이웃어른을 찾아 세배하는 풍습을 찾아 볼 수 없지만, 필자가 어릴 때 만해도 동네에는 세배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웃 어른께 세배를 하지 않으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많은 꾸중을 들었던 시절이다.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도 한다. 새해를 맞아 조상의 묘에 인사하는 것이다. 아침 차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지낸다. 먼 곳에 성묘를 가기위해서다. 지금은 차를 이용하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만 했다. 조선왕조에서도 명당자리를 찾아 궁궐에서 100리 안에 묘를 쓰도록 한 것도 성묘를 가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이 복조리를 메고 골목을 다니며 복조리 사라고 외쳤다. 가정에서는 1년에 필요한 복조리를 사서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어 복조리 장수를 기다렸다. 당시 복조리는 밥을 지을 때 쌀에서 돌을 고르는 유일한 주방도구였다. 요즈음도 복조리를 걸어두는 가정을 볼 수 있다. 설날은 세시 민속놀이가 시작되는 날로 남자는 연날리기, 여자는 널뛰기, 가족끼리는 윷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 고종황제는 세계의 조류에 맞추어 1895년에 태양력(양력)을 도입하여 양력 설과 음력 설을 인정했지만 모든 국민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음력 설을 쇠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태양을 일본 천왕의 상징으로 여겨 양력 설을 쇠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설날이 가까워오면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만들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한다. 일제는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떡방앗간을 폐쇄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 설을 못쇠도록 억압했지만 결국 명절 풍속까지 말살하지는 못했다.
정운일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