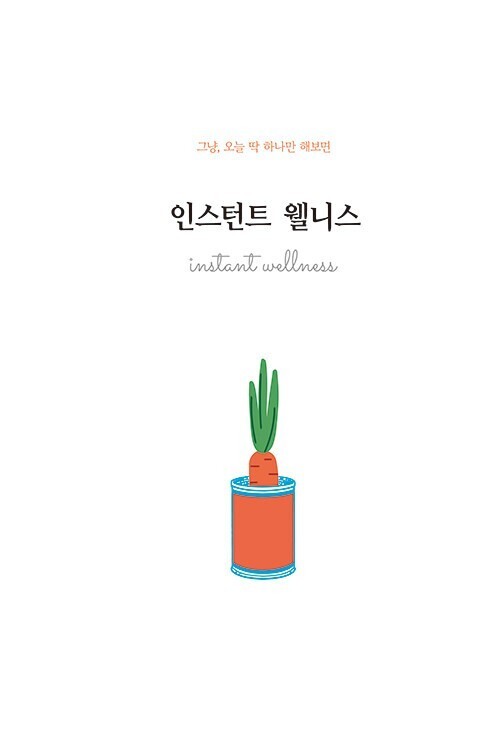절차 복잡하고 준비 부족…'연명의료 중단' 아직 갈길이 멀다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도 확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한 인원은 지난 5일 2명에서 7일 1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미미한 상태다. 존엄사 선택이 가능한 병원도 아직까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12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9517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개월 연명의료사업 시범사업 동안 계획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9370명이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 낮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적 요인과 절차 문제를 꼽고 있다.
이진우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본인 상태를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알리는 환경과 문화가 부족하다”며 “환자 결정권 존중 문화가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이를 위해 의료진의 충분한 진료시간과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계획단계 상태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의사 2인에 의한 진단이 적용된다”며 “외래의 경우 한 명의 진료의사 외 다른 전문의 진료를 한 차례 더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점, 병동에서도 두 명 의사가 같은 내용을 듣고 같은 상황에 대한 확인 서명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 인식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박혜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많은 환자가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원한다”며 “아직은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의료진과 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도 “말기에 대한 고지는 대부분 외래진료실에서 이뤄지는데 3분 진료로는 불가능하다”며 “말기에 대한 고지가 없이 바로 임종기를 얘기하는 것도 상당한 윤리적 거부감이 들 수 있으며 의료진의 임종기 진단 이견과 정확한 시점 예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많은 의료진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