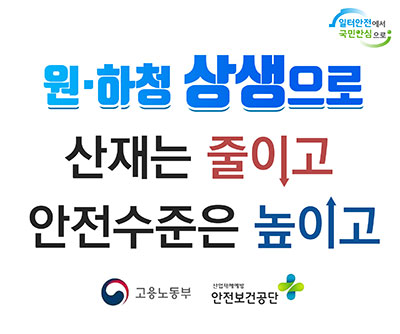15~64세 인구의 70%가 취업한 상태를 뜻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이 ‘국민행복시대’ 달성의 한 지표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의 벽을 고용률 70% 달성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이번 5월 14~64세 고용률이 바로 70%다. 비율로든 규모로든 고용 호조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안정적 경제 구조란 의미의 해석을 붙이기엔 좀 힘들 성싶다.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명 중 7명은 취업자인 셈이니 그 자체로 대단하다. 그런데 고용 증가세와 달리 올해 1~2월 30만 명대를 유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던 증가폭은 8만 명 수준의 둔화세로 바뀐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상향시킬 정도였는데 이젠 달라졌다. 실업률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만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고용안정성, 실질임금 등 질적인 청년 고용 이슈로 한정하면 장밋빛 전망이 무색해진다.
사실은 고용률 증가세를 은퇴 후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노년층 취업자가 이끌었다. 5월엔 60세 이상에서 26만5000명 증가한 반면, 사회 초년생 주기에 해당하는 20대의 취업자는 16만8000명이나 줄었다. 정부가 20대 후반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이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택배·배달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 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눈만 높아 일자리를 걷어찬다고 힐난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질 저하를 더 비중 있게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핵심에 함께 접근해야 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냥 쉬었다”는 청년 실망실업자가 지금도 늘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도시에서조차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된다. 견조한 고용 흐름이라는 자만에 빠지는 대신,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부터 개선해야 한다. 청년 실업으로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부모세대 부양 부담 등이 파생된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이 오르는 것은 취업자 수 감소폭보다 청년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 탓이 크다. 고용률 70%란 통계 앞에서 노동시장 정체와 같은 각종 문제점들이 풀리는 지점이라는 함의는 찾기 어려워 아쉽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를 청년 고용지표가 나아진 걸로 보는 착시도 늘 조심할 점이다.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명 중 7명은 취업자인 셈이니 그 자체로 대단하다. 그런데 고용 증가세와 달리 올해 1~2월 30만 명대를 유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던 증가폭은 8만 명 수준의 둔화세로 바뀐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상향시킬 정도였는데 이젠 달라졌다. 실업률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만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고용안정성, 실질임금 등 질적인 청년 고용 이슈로 한정하면 장밋빛 전망이 무색해진다.
사실은 고용률 증가세를 은퇴 후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노년층 취업자가 이끌었다. 5월엔 60세 이상에서 26만5000명 증가한 반면, 사회 초년생 주기에 해당하는 20대의 취업자는 16만8000명이나 줄었다. 정부가 20대 후반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이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택배·배달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 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눈만 높아 일자리를 걷어찬다고 힐난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질 저하를 더 비중 있게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핵심에 함께 접근해야 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냥 쉬었다”는 청년 실망실업자가 지금도 늘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도시에서조차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된다. 견조한 고용 흐름이라는 자만에 빠지는 대신,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부터 개선해야 한다. 청년 실업으로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부모세대 부양 부담 등이 파생된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이 오르는 것은 취업자 수 감소폭보다 청년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 탓이 크다. 고용률 70%란 통계 앞에서 노동시장 정체와 같은 각종 문제점들이 풀리는 지점이라는 함의는 찾기 어려워 아쉽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를 청년 고용지표가 나아진 걸로 보는 착시도 늘 조심할 점이다.
관련기사
온라인 핫클릭
스포츠 월드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화성 화재현장서 시신 추가 수습 중…실종자 여부 확인 예정”
- 러 외무차관 “북러 합의, 한국이나 제3국 겨냥한 것 아냐”
- 카뱅, 외환서비스 ‘달러박스’…“No.1 뱅킹·핀테크 혁신의 시너지”
- 서울 아파트값 상위 20% vs 하위 20% 격차 사상 최대
- 밸류업 흐름 타고 배당 기업 '확대'…정부 배당 유인책 주시할때
- 탈(脫)서울인 증가…경기·인천은 올해 3.1만명 순이동
- 2분기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익 개선 전망…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 "하반기, 코스피 3200간다"…세계국채지수 편입 시 하반기 상승 전망
- 한화시스템, KF-21 AESA 레이다 첫 양산 돌입… 계약 규모 1100억원
- 서학개미·IRA에 작년 미국 투자 8000억달러 돌파…역대 최대 비중
TODAY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