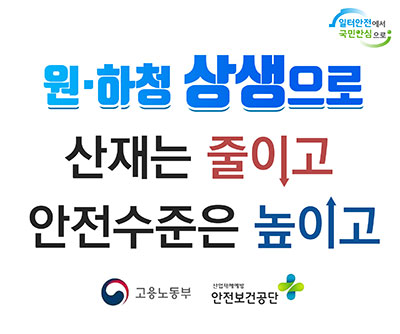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다. 지난 21일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면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지고, 인상률도 5% 이하로 적용됐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여기에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임대차법 개정으로 ‘시장안정’이라는 정부 입장과는 반대로 ‘시장왜곡’으로 이어졌다. 시행 전 우려가 지금은 현실이 됐다. 먼저 주택의 종류나 가격과 상관없이 전세매물은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주택가격 상승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오른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료 폭등을 불러올 악법이라고까지 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7% 올랐다. 게다가 동일 단지, 면적임에도 아파트 전셋값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신규·갱신) 현상이 곳곳에 속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2년 뒤 폭등할 전셋값을 걱정할 처지다.
무엇보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이 심화돼 임대차 분쟁이 시행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거주를 해야한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해도 집주인(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4년 보장은커녕 그냥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집주인은 실제 이사는 안오고 주소이전만 해두는 사례도 왕왕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다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거주가 원칙인 규정이 있어 임대차 시장은 이러저런 복잡한 규제로 마구 뒤엉켜있다.
팔자(賣)가 사자(買)를 만나야 매매가 성사되고 부동산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시장의 순리에 맡겨야 하지만 간혹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정부의 개입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절대 선을 넘거나 역행하지는 말아야 부작용이 없다. 비단 매물유도를 위해 양도세·보유세를 인상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숨통을 조여봤지만, ‘그나마’였던 민간임대는 사라지고 증여만 3배 늘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는 전세난만 부추긴 채 결국 철회됐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외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신을 조장하고 임대시장을 왜곡시켰을 따름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는 실패.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전세난을 해결하고 임대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철폐가 필연적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