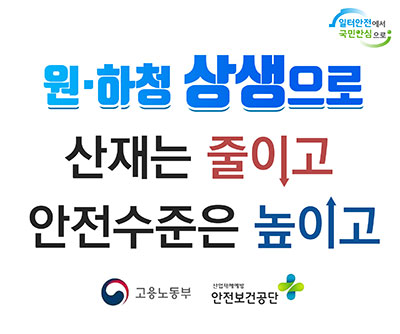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 게티 |
 |
 |
 |
| 게티 |
 |
| 게티 |
 |
 |
 |
| 게티 |
 |
| 게티 |
 |
 |
지금 2016년.
마지막 헌법 개정 1987년.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지금도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을까.
68번째 제헌절을 맞아, ‘개헌’을 살펴봤다.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87년 헌법은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기본권’
29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지금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완벽하게 반영돼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시 독재정치를 거둬내고 ‘대통령직선제’에만 집중한 국민들은 ‘국민기본권’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엄밀히 말하면 87년 헌법은 ‘임시협정’ 개념이었다. 오로지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그렇게 29년이 지났다.
다른 국가가 수 백 년 동안 같은 헌법으로 유지되어 오는 것과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국민 의식이 빠르게 다원화 되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의 속도 또한 눈부시다.
일례로 87년에 개정된 헌법이 91년 시행된 ‘자치’의 개념을 오롯이 담을 수 없었다.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헌법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도층도 ‘개헌’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헌법 개정을 제안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결국 국회의 주인인 국민이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여러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어떠한 권력구조가 미래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거들었다. “개헌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이라는 것.
국민의 걱정, ‘당리당략’
한편, 개헌이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몫하고 있었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보다는 보수-진보로 양분된 정치판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0년 전 국민은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외쳤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개헌이 이뤄졌다.
두고두고 바꾸지 않아도 될 탄탄한 ‘헌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개헌’의 이름으로 포장된 ‘당리당략’은 부릅뜬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자.
“87년 그랬듯이”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카드뉴스] 올해 개봉하는 넷플릭스 K드라마 기대작은?](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2y/01m/06d/2022010601000435000017671.jpg)
![[카드뉴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1y/10m/13d/2021101301000714600030141.jpg)
![[카드뉴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1y/09m/14d/2021091401000982000040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