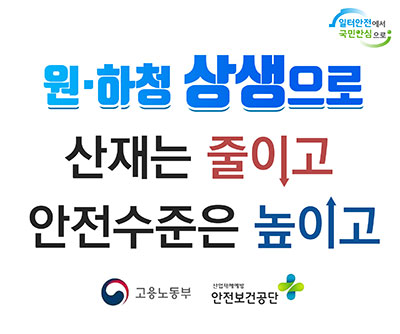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
 |
 |
 |
 |
 |
 |
인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를 했을까? 민주주의의 발원지는 그리스 아테네다. 누구나 제비뽑기를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싸움’이 없었다.
벨기에의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제비뽑기와 교대책임제야말로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서도 2000년 이후 제비뽑기로 대표를 뽑았다. 실험적인 도입이었다.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으로 고대 국가 제비뽑기가 다시 도입됐다. 그러나 시민 반발과 현실괴리로 지금의 보통선거가 도입됐다.
지금 투표 형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시작됐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모든 권력이 국민의 손에 들어왔다.
국민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인 1표제를 도입했다. 후보를 정해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일을 정해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표를 행사하는 것.
1인 1표제는 제한적이었다. 미국과 유럽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일정 재산이 있는 백인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미국에서는 납세할 수 있는 21세 이상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다. 1870년 흑인 남성에게도 투표권이 생겼고, 여성은 50년이 지난 1920년, 투표권이 주워졌다.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 여성들은 백악관 앞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간 결과다.
영국의 경우 여성은 1860년대부터 본격적인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다.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이 국왕의 말에 치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분노한 여성들이 데이비슨 장례식장에 몰려들었고, 그녀의 장례식은 거대한 여성 참정 시위의 장이 됐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권리,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카드뉴스] 올해 개봉하는 넷플릭스 K드라마 기대작은?](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2y/01m/06d/2022010601000435000017671.jpg)
![[카드뉴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1y/10m/13d/2021101301000714600030141.jpg)
![[카드뉴스]](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1y/09m/14d/2021091401000982000040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