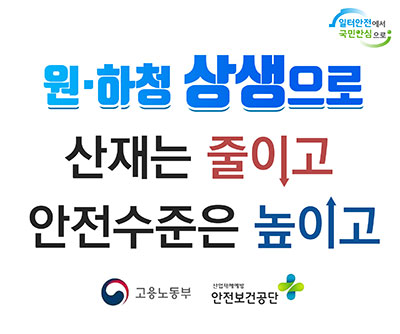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각각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왼쪽) vs 셀트리온 사옥 전경 |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지난해 전세계 연매출이 약 7조4000억원(67억8200만스위스프랑, 전년 대비 4% 증가)에 달한 스위스 로슈 HER2 표적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회사는 허셉틴보다 먼저 특허가 만료된 종양괴사인자억제제(TNF, tumor necrosis factor inhibitors) 계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해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트라스투주맙, 개발명 ‘SB3’, 국내 상품명 ‘삼페넷’)는 지난달 유럽 의약품청(EMA)으로부터 현지 최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시판 승인을 받았다. 내년 초에 경쟁사들보다 한발 빠르게 출시할 예정이다.
온트루잔트는 국내에서도 지난달 ‘삼페넷’이란 상품명으로 허가받았으며,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 허가가 신청됐다. 국내에선 대웅제약, 유럽과 미국에선 MSD가 각각 이 약의 판매를 맡는다.
셀트리온의 ‘허쥬마’(트라스트주맙, 개발명 ‘CT-06’)는 지난 9월 국내에 급여 출시됐다. 가족사인 셀트리온제약이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아 세계 최초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로슈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허셉틴의 제형특허 만료(올해 11월) 직전 발매에 성공했다.
허쥬마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CHMP)가 이 약의 시판승인을 권고해 빠르면 2~3개월내 허가가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미국에 허쥬마의 시판허가를 신청했다.
허셉틴 관련 기술특허는 유럽에서 2014년 7월에 만료된 반면 미국에선 2019년 6월까지 유효하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직후 출시할 수 있지만 미국에선 로슈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에서 의약품 허가가 가장 까다로운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승인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 허가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밀란(Mylan)과 인도 바이오콘(Biocon)이 공동개발한 ‘오기브리’(Ogivri, 트라스트주맙, 개발명 ‘MYL-1401O’)가 미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으로 시판 승인을 받았다.
밀란은 미국 시장 선점을 목표로 지난 3월 로슈와 합의해 허셉틴 특허관련 법적 분쟁요소를 없앴다. 2가지 허셉틴 미국특허 관련 특허무효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이번 합의로 일본·브라질·멕시코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기브리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오기브리는 미국 FDA 산하 백신·생물학제제 자문위원회(VRBPAC)가 만장일치(찬성 16 대 반대 0)로 이 약의 승인을 권고했지만 보건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허가가 예정보다 3개월 지연됐다. 앞서 지난 7월 유럽 EMA는 인도 방갈라루 내 바이콘의 생산시설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밀란은 지난달 EMA에 오기브리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들 업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는 미국 화이자와 암젠이 대표적이다. 화이자의 ‘PF-05280014’, 암젠의 ‘ABP 980’은 지난 9월에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연례회의’에서 오리지널약과 동등성을 입증한 3상 임상결과를 나란히 내놨다.
로슈는 지난달 화이자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허셉틴이 보유한 40가지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 경쟁사의 진입 저지에 나섰다. 허셉틴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약 2조7000억원(25억달러)어치가 팔려 시장성이 크다. 삼성과 셀트리온이 어떠한 전략으로 허셉틴 특허를 돌파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페넷 vs 허쥬마 3상 임상결과
삼페넷은 14개국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총 8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서 허셉틴 대비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들 환자는 삼페넷 또는 허셉틴 투여군으로 나뉘어 각 치료제를 수술전 보조요법(neoadjuvant)으로 24주간 세포독성항암제와 8주기(cycles) 투여했다. 이어 수술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24주간 10주기 투여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유방조직내 병리학적 완전관해율(bpCR, breast pathological complete response rate, 유방조직 내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 비율)이 삼페넷 투여군은 51.7%로 대조군의 허셉틴 투여군의 42%보다 높았다. 삼페넷 투여군의 bpCR을 허셉틴 투여군의 bpCR로 나눈 비율(adjusted ratio, 1.259)이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 90% 신뢰구간(CI, 1.112~1.426)에 들어왔다.
삼페넷은 국내 허가 당시 허셉틴보다 약효가 좋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동등성 인정 논란을 겪었다. 다른 동등성 평가 기준인 삼페넷 투여군과 허셉틴 투여군의 bpCR 차이(adjusted difference)는 평균 10.7%로 미리 설정해둔 인정 범위인 ±13% 안에 들어왔지만 95% 신뢰구간의 상단값이 17.26%로 13%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단값은 4.44%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삼페넷은 임상시험을 진행한 목표대로 국내외 학회·보건당국으로부터 오리지널약 대비 동등성을 인정받았지만 일부 효과·안전성 평가항목에선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삼페넷 투여군 대 허셉틴 투여군은 2차 평가변수인 유방 및 액와림프절의 전체완전관해율(tpCR, total pathologic complete response)이 45.8% 대 35.8%, 전반적반응률(ORR, overall response rate)이 96.3% 대 91.2%로 확인됐다. 수술후 보조요법 포함 1년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12.8% 대 13.2%, 사망한 환자는 1명 대 5명이었다.
허쥬마는 23개국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총 549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서 허셉틴 대비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들 환자는 허쥬마 또는 허셉틴 투여군으로 나뉘어 각 치료제를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세포독성항암제와 24주간 8주기 투여했다. 이어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30주간 최대 10주기 투여했다.
허쥬마 투여군은 1차 평가변수인 tpCR이 46.8%로 허셉틴 투여군의 50.4%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학적으로 FDA 및 EMA의 동등성 인정 요건을 충족했다. bpCR은 51.6% 대 55.1%로 확인됐다. 2차 평가변수인 ORR은 88.3% 대 89.5%이었다. 수술후 보조요법 포함 1년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11.4% 대 10.4%, 심장독성이 발생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각각 3명으로 동일했다.
삼페넷과 허쥬마의 최근 임상연구 결과는 지난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소개됐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유럽서 시작 … 한국·미국, 이제 막 생겨나
유럽은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어 이 산업에 가장 호의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자국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형성돼가는 단계다.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 매출 대부분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EMA는 2006년 4월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인 스위스 산도스(Sandoz)의 성장호르몬제 ‘옴니트롭’(소마토프로핀, somatropin)을 허가했다. 이 약의 오리지널 품목은 미국 화이자의 ‘제노트로핀’이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용어도 EMA가 만들었다. 바이오시밀러는 생물학적제제의 제네릭(복제약)으로 오리지널약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시밀러’(similar)란 단어를 사용한다. 동물세포, 효모, 대장균 등을 이용해 만든 고분자 단백질의약품으로 분자 사이즈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제네릭과 달리 오리지널약과 성상과 약효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약 대비 생물학적동등성(효과, 안전성, 약물대사 등)을 입증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미국은 불과 2~3년 전에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제조·품질관리 규정을 처음 제정했다. FDA는 2015년 3월 미국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인 산도스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자시오’(필그라스팀, filgrastim,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 G-CSF,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를 허가했다. 자시오의 오리지널약은 미국 암젠·일본 쿄와하코기린의 ‘뉴포젠’(필그라스팀)이다.
허셉틴, 개량신약 ‘캐싸일라’로 교체 더뎌 … 당분간 성장 지속할 듯
허셉틴은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된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단백질의 작용을 차단,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포독성항암제인 도세탁셀(docetaxel), 5-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에피루비신(epirubicin)·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등 FEC 3제요법과 병용투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로슈가 2013년 2월에 글로벌 출시한 허셉틴 개량신약(바이오베터)인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당분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싸일라는 허셉틴과 세포독성항암제 성분인 엠탄신을 연결하는 항체·약물 결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로서 허셉틴·세포독성항암제 병용요법 등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캐싸일라는 최소 단위인 100㎎ 한 병당 국내 급여가가 약 213만원, 허셉틴은 150㎎ 한 병당 약 41만원으로 수 배에 달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캐싸일라의 ADC 기술 안정성이 그리 높지 않아 개선할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캐싸일라는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약 9100억원(8억3100만 스위스프랑)으로 7% 증가에 그쳤다. 반면 허셉틴은 1998년 FDA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연간 7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