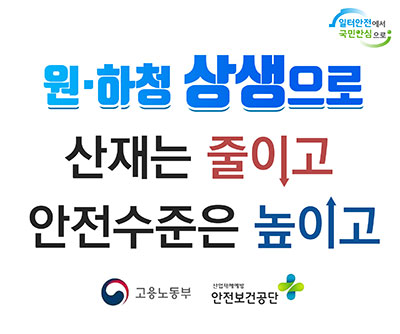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임상시험 보상은 예상하지 못한 약물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만 관련 진료비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환자의 자발적 참여이므로 임상시험 중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난치병을 더 진보된 약으로 치료하기 위해, 또는 질병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보려고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보려는 환자가 늘고 있다. 환자 커뮤니티엔 신약의 효능·부작용 정보를 캐보려는 임상시험 희망자의 정보전이 뜨겁다. 하지만 임상등록 정보가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와 일반 독자를 위해 임상시험 진행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봤다.
임상시험 자원자는 모집 공고를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하면 연구자 또는 임상연구코디네이터로부터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적합자를 선별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다. 임상연구 중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로 유지된다.
윤건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표준치료) 대비 새로운 약을 추가한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라며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윤리심의위원회(IRB)가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등을 보고 사전에 임상시험 진행 절차 상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은 대부분 시험약과 위약 투여 그룹으로 1대 1 무작위 배정하지만 위약 대조군이라 해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며 “위약군은 최선의 보조치료(best supportive care)를 받고, 시험약 투여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시험에 참여하기 전보다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검사도 무료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표준치료법에 위약 또는 시험약을 추가하거나, 각 환자군이 시차를 두고 대조군 역할을 번갈아 하는 교차연구(crossover study)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위약군에게도 신약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주는 추세”라며 “2차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신약이 1차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상에선 대조군은 1차치료제로 이 신약을 투여받지 못할 뿐 2차 표준요법으로 항암신약을 투여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교차연구에서 한 그룹은 연구 전반기에 시험약을 투여한 후 후반기에 대조약을, 다른 그룹은 먼저 대조약을 투여한 다음 나중에 시험약을 투여한다. 국내에 표준치료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거나, 출시된 치료제의 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말그대로 가짜약(위약)을 투여하기도 한다.
윤 교수는 “국내 임상은 해외에서 허가가 임박한 신약을 한국인에 적용하는 3상 임상이 주를 이룬다”며 “3상 임상은 효과와 부작용을 탐색하는 1·2상 임상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평했다.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계획서에 약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는 게 필수”라며 “보상에 대비해 임상연구보험을 가입한 후에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과제라도 각 단계마다 보상 절차와 연구비 등은 천차만별이다.
이대호 교수는 “보상은 예상하지 못한 약물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만 진료비 등에 한해 지원된다”며 “연구자·제약사 등 임상연구 관계자의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배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20여년 전에 비해 10배가량 커졌고, 환자의 안전성 관리, 의료·제약 기술, 정보 보안 등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성장했다”며 “임상의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늘어났지만 전체 임상 건수를 감안하면 부작용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관리기준(KGCP) 등 국내의 관련 규정 중 일부는 미국을 주축으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해외 보건당국이 그런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 현지 상황을 이해한 후에 국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각종 법규가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인체유래물 연구(환자의 조직을 떼내 연구)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환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동의서에 적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 진행 현황은 국제 임상등록 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 국내 사이트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 전문용어로 이뤄져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환자단체는 지난 7월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들 정보를 환자가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연구진은 임상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과거 임상시험 자료, 의무기록 등을 후향(retrospective) 분석하는 임상연구는 시작 단계부터 설계 방식 등을 모두 공개하면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도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상시험은 환자를 모집해서 이들의 상태 변화를 미래 지향적으로 관찰하는 전향(prospective) 연구로 정의된다. 임상시험과 후향 분석하는 임상연구의 정보 공개 범위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제약사 등이 후원하는 스폰서주도임상(SIT, sponsor-initiated trial)은 임상시험 사이트에 모두 등록돼 있는 반면 연구자주도임상(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은 일부만 등록돼 있다”며 “연구자주도임상 등록도 의무화해 임상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