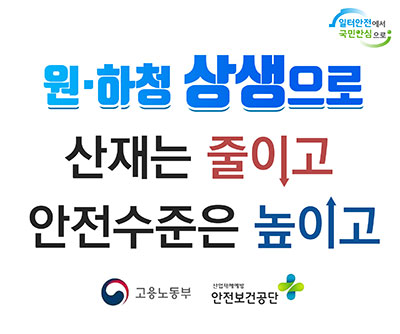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왼쪽) vs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 |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트산, abiraterone acetate)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가 세계 전립선암(prostate cancer, PC) 치료제 시장 선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적응증 확대 측면에서는 자이티가가, 복용 편의성 및 판매액 측면에선 엑스탄디가 앞선다.
얀센은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자이티가의 3상 임상 ‘LATITUDE’ 결과를 근거로 유럽위원회(EC)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이티가를 안드로겐 박탈요법(ADT, androgen deprivation therapy)과 병용해 전이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엑스탄디와 마찬가지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에만 처방됐다.
한국임상암학회에 따르면 국소 전이성암(1~2기) 환자 중 25~30%는 방사선치료, 근치적절제술 등을 받은 후에 재발하거나 뼈·림프절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 국소진행성(3기) 및 전이성(4기, metastatic) 전립선암의 약물요법은 호르몬반응성 전립선암(hormone-sensitive, HSPC), 거세저항성 전립선암(호르몬불응성, castrate-resistant, CRPC)이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차 약물치료로 혈중 남성호르몬을 거세 수준까지 낮추는 ADT를 시행한다. 국소 및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의 5년생존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은 약 30%에 그친다. CRPC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ADT 약 성분으로는 성선자극호르몬 효능제(GnRH,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고세렐린, goserelin) 및 ‘카소덱스’(비카루타미드, bicalutamide), GnRH 길항제(antagonist)인 한국페링제약의 ‘퍼마곤’(데가렐릭스, degarelix) 등 항안드로겐(antiandrogen) 제제가 처방된다.
ADT는 초기에 효과적이지만 18개월 이상 시행하면 환자 4명 중 1명은 내성이 생겨 CRPC로 진행된다. CRPC의 표준치료는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도세탁셀(docetaxel)을 포함한 화학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항안드로겐인 자이티가 및 엑스탄디, 새 세포독성항암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제브티나’(카바지탁셀, cabazitaxel) 등으로 약제 선택폭이 넓어졌다.
자이티가와 엑스탄디는 남성호르몬 수용체 길항제로 이 수용체의 기능을 소실시켜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
자이티가는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DEHA, dehydroepiandrosterone)가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CYP17 효소를 억제해 전립선암세포·고환·부신 등에서 안드로겐 생성경로를 차단한다.
엑스탄디는 안드로겐이 세포 내 핵 안으로 들어와 DNA와 결합하는 것을 막는다. 유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연구단 연구위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생화학과 박사후연구원으로 지낸 시절에 그를 지도한 마이클 정(Michael Jung) 교수, 찰스 소이어(Charles Sawyer) 미국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MSKCC) 종양학 교수팀 등과 개발을 주도했다.
자이티가와 엑스탄디는 경구 제형으로 ADT에 쓰이는 기존 호르몬제나 세포독성항암제가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엑스탄디는 1일 1회 40㎎ 4캡슐(총 160㎎)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한다. 반면 자이티가는 1일 1회 250㎎ 4정(총 1000㎎)을 공복에 복용하고, 스테로이드제인 저용량의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함께 경구 투여해야 한다.
국내에선 2014년 11월부터 엑스탄디가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방식으로 도세탁셀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자이티가는 엑스탄디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환자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급여 처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이티가가 국내외 출시는 빨랐지만 매출에서 엑스탄디에 밀리는 상황이다. 자이티가는 2011년 4월 미국에 이어 그 해 9월 유럽에서 시판승인을 받았다. 엑스탄디는 2012년 8월 미국 및 2013년 6월 유럽에서 허가받았으며, 미국에선 화이자가 공동 마케팅하고 있다.
자이티가는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5억1900만달러(약 5590억원)로 전년 5억8100만달러(약 6290억원) 대비 10.7% 줄었다. 2012년 9억6100만달러(약 1조450억원)에서 2014년 22억달러(약 2조3920억원)로 급성장했지만 이후 엑스탄디보다 저조했다.
엑스탄디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일본 회계연도 기준) 12개월간 2959억엔(약 2조8560억원)어치가 팔려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월 미국 제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는 엑스탄디가 2022년에 항암제 매출 9위(47억1000만달러, 약5조122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엑스탄디는 약 188억원, 자이티가는 약 12억원어치 각각 팔렸다. 이들 약이 모두 비급여로 처방된 2014년 상반기에 자이티가(약 6억2000만원)가 엑스탄디(약 2억7000만원)와 2배 이상 격차를 벌였던 때와는 천양지차로 역전됐다.
자이티가의 LATITUDE 임상은 mHSPC 고위험군 환자 1199명을 대상으로 위약대조·이중맹검·무작위배정·다기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환자는 모두 △전립선암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점수(Gleason score, 0~10점 점수가 높을수이 심각)가 8점 이상 △3곳 이상의 뼈전이 △3곳 이상의 내장전이(visceral metastases) 등 3가지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연구 결과 자이티가·ADT요법 병용군은 장기생존자가 많아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반면 위약·ADT요법 병용군은 34.7개월에 그쳤다. 자이티가·ADT 병용군 대 위약·ADT 병용군의 방사선학적 무진행생존기간(rPFS, radiographic progression-free survival) 중앙값은 33개월 대 14.8개월이었다. 이로써 자이티가는 위약 대비 사망위험을 38%, 질병악화위험을 53% 낮췄다.
자이티가의 중증 이상반응은 고혈압(20% 대 위약 10%), 저칼륨혈증(10.4% 대 1.3%), 간수치 상승(5.5% 대 1.3%)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자이티가·ADT 병용치료는 mHSPC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른 임상연구 결과 3년생존율이 83%로 위약·ADT 병용군의 76%보다 높았다. 자이티가는 위약 대비 치료실패율을 71% 낮췄다. 이들 2건의 연구결과는 지난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지난 6월 자이티가가 이번 ASCO에서 발표한 2건의 임상연구 결과에 힘입어 곧 35억달러(약 3조8060억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스텔라스는 올해 ASCO에서 mCRPC 환자 2792명의 진료현장(real worl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얀센에 반격했다. 연구 결과 화학항암요법을 받은 적 없는 그룹 내 엑스탄디 투여군은 평균 치료지속기간이 240일로 자이티가 투여군의 186일보다 64일 길었으며, 화학항암요법 치료경험이 있는 그룹에선 두 약제의 치료 지속성이 유사했다.
이어 지난 9월에 진행 중인 3상 임상 ‘PROSPER’에서 엑스탄디의 적응증을 도세탁셀 화학항암요법을 적용하기 이전인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임상에는 ADT로 치료받았음에도 질병이 진행된 비(非)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1440명이 참여했다.
아스텔라스는 이 연구를 통해 엑스탄디·ADT 병용요법이 1차 평가변수인 전이되기까지 걸린 기간(MFS, metastasis free survival)에서 위약·ADT 병용군 대비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3개월 전인 지난 6월 환자 규모를 원래 계획했던 1560명에서 120명을 줄이고, 1차 및 2차 평가변수를 수정해 연구 종료시점을 예정(2020년 5월)보다 2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이티가의 추격을 의식하는 눈치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이티가와 마찬가지로 mHSPC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엑스탄디의 3상 임상 ‘EMBARK’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3상 임상 ‘ENDEAR’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DT에 실패한 mCRPC 환자가 참여한 3상 임상 ‘AFFIRM’ 및 ‘PREVAIL’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엑스탄디는 무력증·피로, 두통, 안면홍조, 고혈압 등 이상반응이 환자의 1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