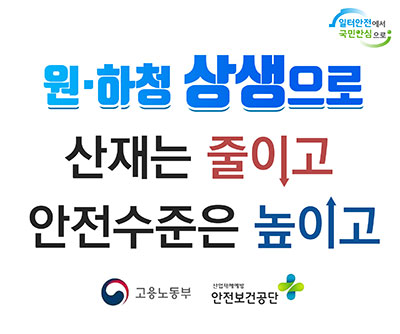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
|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의 연구 결과 정자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난자에 동시에 주입하면(아래쪽)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에 유전자가위를 적용할 때(위쪽)와 달리 유전자가 교정된 세포와 교정되지 않은 세포가 섞여있는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지난달 3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 nuclease)로 인간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을 일으키는 MYBPC3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국내에선 규제로 인간배아에 관련 유전자가위를 적용할 수 없어 슈크라트 미탈리포프(Shoukhrat Mitalipov)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교수팀에 자체 제작한 유전자가위를 제공하고 실험을 맡겨야 했다.
국내 생명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희귀·난치병을 연구할 때만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후성심근증은 법이 허용하는 관련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에 제정된 낡은 국내법 때문에 해외에서 실험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천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에서 유전자가위의 효과와 정확성을 입증해 전세계 주목을 받았다. 미탈리포프 교수팀은 MYBPC3 유전자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얻은 정자와 김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정상인 난자에 주입했다. 수정 후에 배아가 난자의 MYBPC3 정상 유전자를 이용해 정자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체할 외부 DNA를 도입하지 않고 유전자가위만으로 변이유전자를 교정한 것이다.
비후성심근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5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심부전증이 나타나고 젊은 나이에 돌연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11번 염색체에 있는 MYBPC3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발생하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 중 한 명이 MYBPC3 유전자변이를 가질 경우 가족성 비후성심근증이 자녀에 유전될 확률은 50%다. 연구진은 인간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해 비후성심근증 변이유전자가 자녀에 유전될 확률을 기존 50%에서 27.6%로 낮췄다.
김 교수팀은 정자와 유전자가위를 동시에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같은 배아에서 유전자가 교정된 세포와 교정되지 않은 세포가 섞여있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했다. 기존 기술은 수정 후에 뒤늦게 유전자가위를 주입해 모자이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김 교수팀은 또 절단유전체시퀀싱(Digenome-sequencing, 유전자가위 처리 전후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결과 잘못 절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23개 비(非)표적 절단 위치(potential off target) 중 어떤 곳에서도 유전자가위가 오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3일 국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인간배아를 활용한 유전자교정 연구가 안전성과 생명윤리성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진수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공청회에서 “국내 생명윤리법은 유전자변이 여부를 알 수 없는 잔여배아만 연구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교정 실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체내 유전자치료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인간배아를 사람에 적용하는 임상연구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험연구는 허용하는 추세”라며 “고장난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바꾸는 질병치료 연구와 외모·성격·지능 등을 개선한 맞춤형아기 연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방욱 아시아생명윤리학회장(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은 “이번 김진수 교수팀의 연구는 유전자가위가 인간배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밝힌 원리증명 실험에 가깝다”며 “실험에 성공해도 임상에 적용하기까기 꽤 긴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규제를 완화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거나, 연구자금이 특정 분야에 왜곡 투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간배아에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배아가 사용될 것”이라며 “생명윤리법은 사회적 합의이므로 소수의 학자나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염기(base)만 자르는 인공효소로 박테리아의 면역체계에서 유래했다. 세균이 자기 안으로 침투한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보유했다가 바이러스가 2차 공격할 때 유전자가위를 구성 요소 중 하나인 Cas9 절단효소를 작동케한다는 게 방어기전의 원리다.
유전자가위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가이드(guide) RNA와 절단효소인 Cas9 단백질로 이뤄진다. 표적유전자를 없애거나, 추가하거나, 다른 염기서열로 교체할 수 있다. 기존 유전자가위보다 제조가 간편하고 자르는 정확도가 높아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난치성 유전질환이 자손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 셈이다.
염색체(DNA)는 아데닌(A)·구아닌(G)·시토신(C)·티민(T)이라는 염기 4종이 특정 순서로 배열돼 있는데 이들 순서가 생물의 차이를 만든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총 24자가 조합돼 의미있는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4가지 염기 배열은 신체 기능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구성한다. 유전질환은 이 DNA 염기서열이 잘못됐을 때 발병하며, 혈우병·겸상적혈구빈혈증·헌팅턴무도병 등 종류가 약 1만가지에 달한다.
김진수 교수는 2003년부터 유전자교정에 활용된 1세대 징크핑거(ZFN, Zinc figer nuclease), 2011년에 새롭게 등장한 2세대 탈렌(TALEN, TAL effector nuclease)에 이어 최근에 개발된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까지 모두 연구한 이 분야의 세계적 선구자로 꼽힌다. ‘유전자가위(programmable nuclease)’라는 용어의 영어와 한글 이름 모두 그가 붙인 것이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