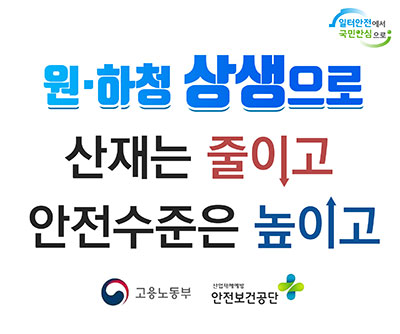“이제 대한민국에 지쳤다.”
내년 캐나다로의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김민영(가명·37)씨의 말이다. 김씨는 “취업과 결혼 등 상대적으로 소박한 꿈을 이루는 데도 너무나 힘든 인생”이라며 “이런 힘든 삶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민을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이민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는 김씨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3일 법무부와 이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김씨처럼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국포자’(국적 포기자)다. 이민에 관대해지고 개인 삶을 중시하게 된 것도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지나친 경쟁’ ‘열악한 교육환경’ ‘소득불평등’ 등 이른바 사회안전망 해체에 따른 부작용들이 사유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적 포기자 수는 날로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항상 우위에 있던 취득자 수마저 넘어섰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올들어 3월까지 우리나라 국적 취득자는 3999명, 국적 포기자는 4580명이다. 이미 지난해 국적 취득자는 1만4200명,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포기자가 취득자를 압도했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또 미국의 시민권 포럼 사이트 ‘아이작브록소사이어티’(Isaac Brock Society)는 최근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 건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뉴질랜드는 4.5명, 일본은 89명, 폴란드 17.7명, 미국 28명, 싱가포르는 431명이지만 한국은 무려 1680명에 달했다. 사이트는 “한국은 국적 상실자가 연간 2만5000명으로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이중 국적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국적 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미주 한인은 무려 3만1419명에 달한다. 뉴욕총영사관이 집계한 지난해 국적 이탈 건수는 256건으로 전년보다 65%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스티븐 윤(17)군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이유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2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막연하지만 이민을 생각해봤거나(69%), 구체적으로 이민을 고려해 본 것으로(7.4%) 나타났다. ‘이민’의 무게를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좀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라는 의견, 열악한 교육환경, 과열된 경쟁구조, 취약한 복지정책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수원화성시민연대 양대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이민 고려 이유 중 하나일만큼 이민의 욕망 속에는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절망적 시선이 투영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페리호 침몰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재난 사고 이후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는다는 것도 사실로 입증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1993년~1995년 3년간 평균 이민자 수는 1992년 1만4477명에서 1만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때인 1998년에는 전년 1만2484명에서 1만3974명으로 늘었다. K 이민정보업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민자가 늘었다”며 “과거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택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택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민 준비 연령층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명예퇴직을 한 40~50대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30대가 많고 심지어 20대들도 볼 수 있다. 이민 정보업체 S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20~30대 직장인들도 찾아와 캐나다나 뉴질랜드, 북유럽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논리가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는 문제를 제어하고 그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에 성숙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회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과 세계 최고 자살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금주의 이슈&이슈] 고리1호기 영구정지](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17y/06m/19d/20170618010006373_1.png)
![[금주의 이슈&이슈] 최순실 '국정농단' 9개월만에 첫 판결](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17y/06m/18d/2017061801001391300063421.jpg)
![[금주의 이슈&이슈] 더민주, 호남의 선택은 … 검찰 박근혜 영장은 언제?](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17y/03m/26d/2017032601002019700090411.jpg)